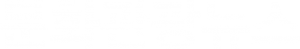최근 방영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홍대의 한 미어캣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나왔다. 카페 실내에서 사육되고 있던 미어캣은 사람들의 어깨의 올라타고, 무릎에 앉는 등 경계가 없었고, 패널들은 이 모습을 두고 ‘귀엽다’고 리액션을 취했다.
방송에 나온 것과 같은 동물 카페, 실내 동물원이 성행하게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일반적인 야외 동물원과 규모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멀리 갈 필요 없이 도심에서 손쉽게 동물을 볼 수 있기에 ‘이색 데이트 코스’, ‘키즈카페 대용’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물 카페의 시초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신이 기르는 개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애견카페가 그 시초로, 시간이 지나면서 카페에서 다수의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전시 형태로 진화했다. 비슷한 카페가 늘어나다보니 업주들은 손님을 끌어 모으기 위해 야생동물을 끌어들였다. 라쿤을 시작으로 미어캣, 사막여우, 앵무새 등 야생동물 카페가 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동물복지문제연구소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온라인 검색으로 파악한 곳만 95곳이 넘으며,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 카페는 기본적으로 ‘체험’이 기본이다. 업주들은 동물을 직접 만지는 행위를 권장하고 있다. 카페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은 최상위 포식자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일상이다.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동물원이기 때문에 사육환경이 동물 중심으로 이뤄져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열대우림에 사는 새 토코투칸과 건조한 모래사막에 사는 사막여우가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다. 야생에서는 절대 만날 일 없는 오스트렐리아의 왈라비와 아프리카의 미어캣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기도 한다. 동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시설을 갖췄다고 하지만, 애초에 야생동물이 햇빛 한 줌 안 들어오는 실내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관람객이 북적북적한 분위기 속에서 동물들은 괜찮을까. 예민한 동물인 사막여우는 끊이지 않는 소음과 관람객들의 시선에 불안했으며, 몇몇 동물들은 몸을 숨길 곳이 없어 구석에서 떨고 있기도 했다.
이색 동물이 인기를 끌다보니 급기야는 이동식 동물원도 등장했다. 동물을 이동 시켜서 고객이 원하는 공간, 원하는 시간에 작은 동물원을 차리는 서비스다. 주요 방문 장소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마트 문화센터 등이다. ‘생태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전시가 이뤄지는데, 관람객 유치가 목적이 아니라 이동전시에 사용되는 동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육 환경이 일반 동물원보다 훨씬 열악하다. 배설물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뜬장에 동물을 가둬놓는 것은 일반적인 수준일 정도다. 안전관리 또한 미흡해 건물 외부 주차장 등에 동물 사육장을 만든 경우도 있었다. 이동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이동식 동물원이 열리는 장소는 위생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을 수도 있다.
인수공통전염병이란 사람과 동물 양쪽 다 감염될 수 있는 전염병으로, 특히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병을 말한다. 그 수는 100가지 이상이며, 메르스나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같이 위험한 질병도 포함되어 있다. 전염병의 발병 소지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과학자들 조차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 4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럽 미생물 및 전염병 학회’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일부 체험 동물원의 동물들은 여러 종류의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강력한 균을 보유하고 있어, 체험형 동물원이 슈퍼 박테리아의 잠재적 온상이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연구진은 “동물이 외관상 건강해 보인다고 병원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며, 전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엄격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었다.
지난 4월에 발의된 동물원법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감안해 동물원을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라쿤카페 금지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식품접객업소로 등록된 시설에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에 속하는 야생동물을 영리목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관련 업체는 법 공포 후 3개월 안에 보유 동물 현황과 적정 처리계획을 환경부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 카페와 사립 동물원 등 중소형 동물사업체 관계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한국동물문화산업협회는 “동물원법 개정안에는 사업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90% 이상 폐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폐업할 경우 수만 마리에 달하는 동물은 누가 관리할 것이며, 대책 없는 법안이 안락사를 조장하고 자영업자를 내몬다”고 성토했다.
동물권단체는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동물 카페는 음료와 디저트 같은 것을 파는 곳이고, 실제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된 업장도 다수에 이른다. 동물 카페를 찾은 일부 어린 아이들은 동물을 만진 손을 입에 가져다 대거나 맨손으로 음식을 먹기도 하는 등, 위생과 체험에 있어 허점이 있다. 특히 “야생동물 카페나 체험형 동물원을 산업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후진국 적인 발상”이라며 “여러 선진국은 동물복지와 공중보건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길러서는 안되는 동물, 길러도 되는 동물을 법률로 규정해 놓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동물원 자체는 동물학대의 온상이라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인간의 욕심으로 우리에 가둬 ‘전시’하는 형태에,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의 접근, 소음 등이 동물에게는 큰 스트레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동물원도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여기에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동물을 보고 싶고’,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 인간의 이기심이 ‘체험형 실내 동물원’을 탄생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물원 동물들이 관람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최소한의 울타리마저 무너졌고, 동물들의 숨통은 더 강하게 조여졌다.
TV나 영화, 화면으로만 보던 야생동물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경험은 분명 특별하다. 하지만 그 동물이 불행하다면 우리는 마냥 즐거울 수 있을까? 이상행동을 하고 고통 받는 모습조차 귀엽고 예쁘게만 보인다면, 야생동물을 실제로 보는 것은 진정한 ‘교육’도 ‘교감’도 아닐 것이다.
오진선 기자 sumaurora@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