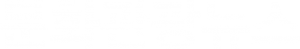가마솥더위 속 감각을 깨우는 서울의 청각 여행지 4선
[서울]박순영 기자 psy@newsone.co.kr
여름 더위는 몸보다 마음의 감각을 먼저 무디게 만든다. 그럴 때면 잠시 눈을 감고 귀를 열어보자. 바쁜 일상에 묻혀 잊고 있던 소리들이 다시 고개를 든다. 들리는 것 너머에 있는 감정과 기억을 만나는 일. 서울의 한복판에서 조용히 청각에 집중할 수 있는 여행지 네 곳을 소개한다.
 세계가 주목한 ‘소리의 박물관’, 오디움
세계가 주목한 ‘소리의 박물관’, 오디움
도심 한복판, 울창한 수직의 숲처럼 알루미늄 파이프가 감싸고 있는 건물. 이곳은 올해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2025 베르사유 건축상’ 후보에 오른 오디오 박물관 오디움이다. 세계적 건축가 쿠마 켄고가 설계한 공간답게, 건축과 소리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지하 2층부터 3층까지, 100년이 넘는 오디오 역사를 따라가며 카메라 1,500여 대와 10만 장의 바이닐이 전하는 진동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입장 전 예약이 필수인 개관전 <정음(正音)>은 하루 125명만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소리’에 대한 탐구 여정이다. 목재와 음향판이 어우러진 전시장은 그 자체로 악기이며, 오디오 애호가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낯선 감동을 안긴다.
소리로 유물을 만나다, 국립중앙박물관 ‘공간_사이’
서울의 대표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이제 ‘듣는 박물관’으로도 거듭났다. 조각공예관 사이에 마련된 ‘공간_사이’는 한국 전통 범종의 울림을 청각·시각·촉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몰입형 전시 공간이다.
성덕대왕신종의 은은한 맥놀이를 진동과 시각효과로 구현했으며, 셰이커 진동이 부착된 청음 의자에 앉으면 종소리가 단지 ‘들리는’ 것이 아닌, 온몸을 타고 흐르는 ‘체험’이 된다. 박물관을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공간이라 여겨왔다면, 이곳에서 감각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다.
산사의 울림, 진관사에서 듣는 자연의 소리
서울의 북쪽 끝, 북한산 자락에 자리한 진관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소리이다. 계곡물 흐르는 소리, 숲을 가르는 바람, 그리고 해 질 무렵 들리는 범종의 울림까지. 동정각의 범종은 매일 새벽과 저녁, 각각 28번과 33번 타종되며 우주 만물의 번뇌를 씻는다고 전해진다.
진관사는 그 소리를 안주 삼아 머무르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전통 다실 ‘연지원’에서 극락교를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고, 함월당에서 템플스테이를 한다면 아침 종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특별한 경험이 기다린다. 눈으로 보는 산사가 아닌, 귀로 듣는 산사는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준다.
어둠 속 진짜 감각을 만나다, 북촌 ‘어둠속의 대화’
북촌 한옥마을 인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전시장 안에서는 오히려 모든 것이 뚜렷해진다. ‘어둠속의 대화’는 시각을 차단한 채, 청각과 촉각을 통해 새로운 감각을 발견하는 체험 전시다. 로드 마스터라 불리는 시각장애인 안내자와 함께 걷는 100분의 여정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 누군가의 숨결, 나지막한 말 한마디가 깊이 있게 다가온다. ‘회상기억 그리고 추억의 전람’이라는 부제처럼, 소리는 기억의 문을 열고 사람 사이의 진심을 이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서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 혼자라면 내면의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된다.
감각의 여름, 소리를 향한 여행
여행은 멀리 떠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때로는 익숙한 공간에서 낯선 감각을 여는 것이 더 특별한 여정이 될 수 있다. 이번 여름, 서울에서 소리에 집중하는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마음이 조용해지는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자신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